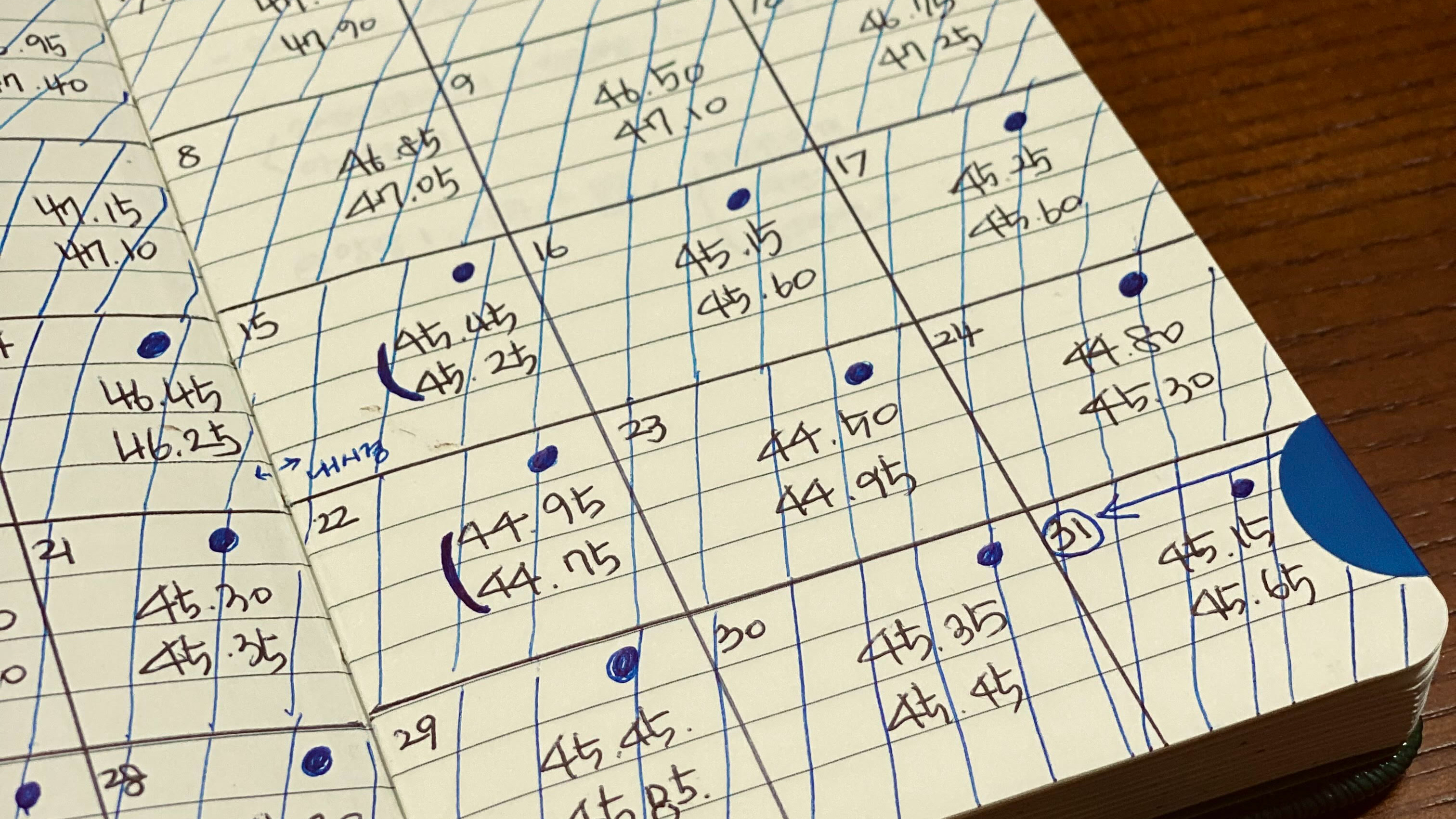Episode 0. Writing <Prologue>
-
처음 내가 글을 쓰기 시작했던 건
버스 위에서였다.
야근을 끝내고, 귀가하던 어느 날의
퇴근길.
아침에 봤던 해는 사라지고,
어둠이 가득 내려앉은 세상 위
모두들 집에서 저마다의 밤을 보내는 시간.
나는 줄곧 혼자 자정의 버스 위에 있었다.
차창밖의 볕은 이미 짙푸른 어둠이어서
여기 나의 존재도 묻혀버리고 마는,
먹먹히 어스름풋하게 비치는 것이 전부인
그런 자정을 뒤로
적어 내려 가기 시작했다.
매우 좋았던 것들과
매우 속상했던 것들.
매우 터덜거렸던 것들과
매우 삐걱이던 것들.
매우 사랑했던 것들과,
사랑했던 만큼
매우 그리워했던 것들
그런 어느 날의 나에 관한 글.
-
이렇게 적어 버리고 나면,
집요하게 엉켜있던 생각들은
사각사각 햇볕에 부서져
마른빨래를 차곡차곡 개서 접혀둔 듯이
정리되곤 했다.
문장으로 적어버리고 나면
지난밤 퇴근길 달의 크기만큼
커다랗던 상념은
한 줄의 문장에 가둬놓을 수 있었다.
피곤하기만 하던 복잡한 일들은
하나 둘 슬며시 정리가 되어
제 자리에 놓이는 것 같았다.
매일 SNS에는 수만 장의 사진들과 글들이
이미 수면 위에 차고 넘쳐 오르지만,
정작 퇴근길 숱한 키워드 검색으로도,
오늘로부터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도무지 찾아낼 수 없었을 때.
나는 글을 쓰고,
타인의 글을 읽기 시작했다.
침대에 가만히 누워
누군가 차곡히 써 내려간 문장들을
동이 틀 때까지 잠드는 내내
읊조리다 눈을 감는 일은
막연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킬 방법을 얻기 위해 찾아나간 방법
중 하나였다.
생채기 난 곳에는 마데카솔 분말을
얼른 덮어주어야 새 살을 얻을 수 있듯이
나 역시 오늘의 스스로를 덮고,
내일을 보내기 위함으로
글을 읽고 적었다.
-
그리고 남기고 싶었다.
뒤돌아서면 고개를 비추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것들 사이로
순간순간 느끼는
가장 날 것의 나에 관해.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기록하기 위함이었다.
찰나 같은 나라는 인간의
어떤 생에 관해.
내가 아니면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나의 순간에 관해.
세상은 이런 나에 비해
계산할 수 없이
가늠할 수도 없이
커다랗다는데
내가 오늘도 여기서 성실히,
이렇다 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꼬박꼬박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
꼬박꼬박 살 방법을 찾아,
살아나가고 있다는 걸 남겨야 했다.
그런 짧고 간결한 몇 줄의 문장을
기록함으로써
내가 자정을 넘어온 오늘 이 길 위에서 만났던
태산 같던 '턱'들과 '터널과 틈'
조우했던 방지턱 같던 사람들과
세상을 상기하고자 했다.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까지
주말이면 나의 키를
방문 옆 기록해주던 아빠는
멈춰버린 나의 성장을 끝으로
더 이상 나를 대신해 나를 기록해줄 수 없으므로.
나에 관해
남겨 두고 싶어서
적기 시작했었던 것이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나는 글을 적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