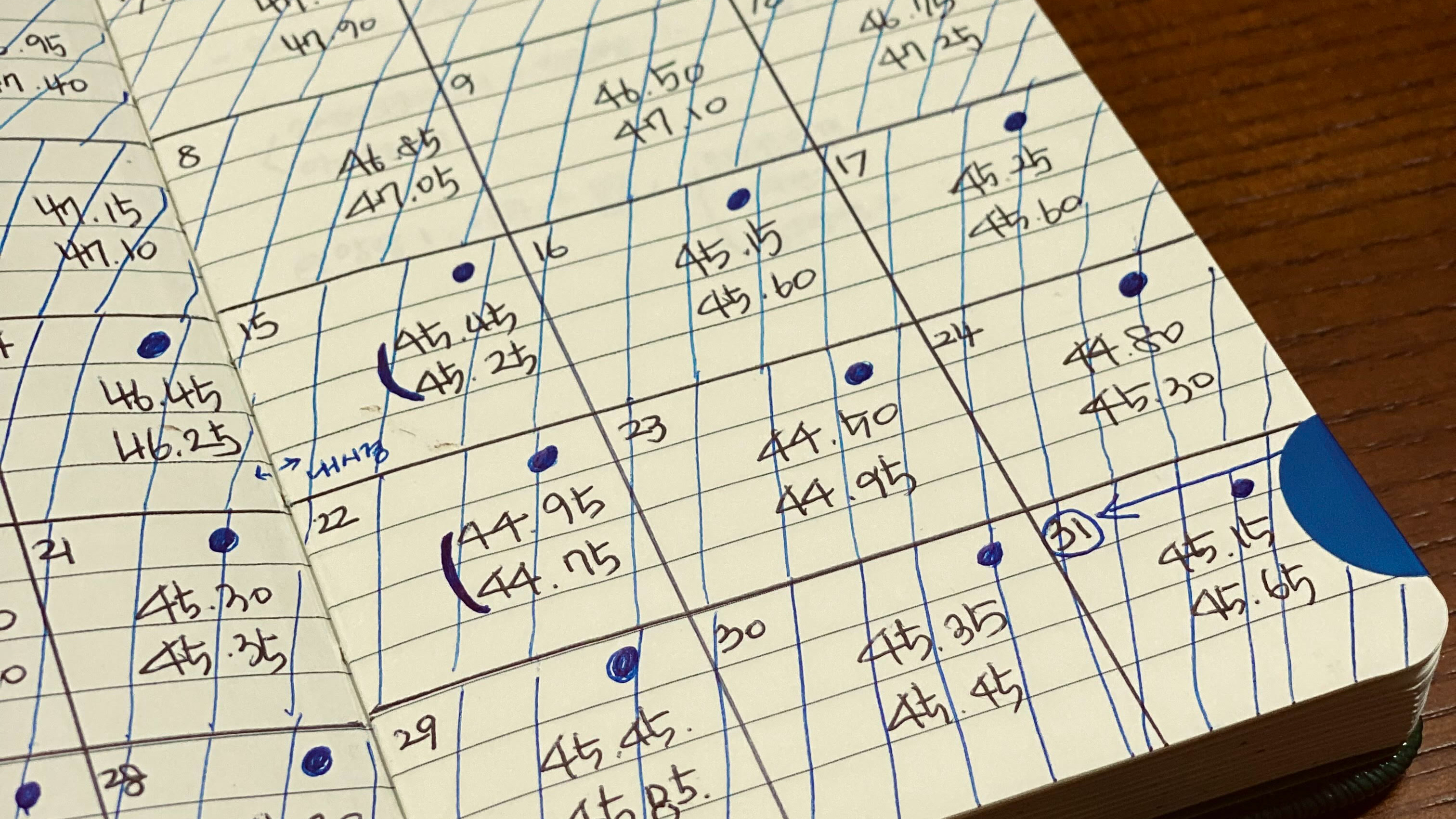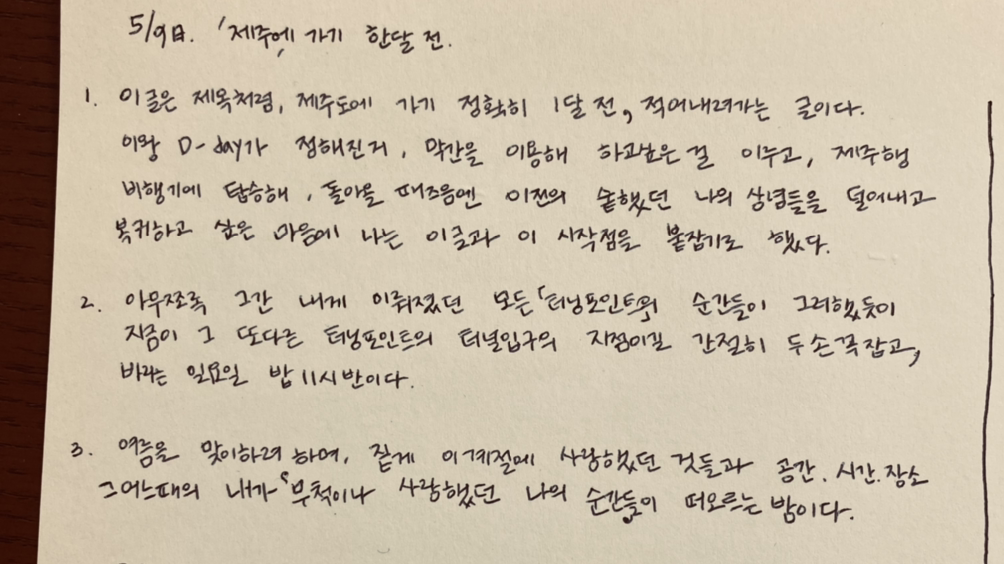Episode 1. Cherry tree <When spring comes>
-
입사 첫 해 두어 달쯤 지났을 봄이었다.
으레 모든 사회초년생이 그러할 듯,
나 역시 마치 내가 나인지 전 날 잡고 있었던
일이었는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간밤의 꿈이 현실인지, 꿈이었는지도
경계가 모호해질 만큼.
흐리멍텅 정신없이
일상과 업무가 뒤엉켜있었을 때였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출근을 하는 중이었는데,
눈을 반쯤 감은채 기대어 누운 버스 창 너머로
도시조경의 일부였을,
벚나무가 빼곡히 쉴 새 없이 지나쳐가며
일렬로 눈에 들어왔다.
' 아 봄인가 보다.. '
사실 봄이고 뭐고 중요할 것도 없던 찰나
저마다 빼곡히 만개하던 벚나무들 사이,
길고 쭉쭉 흐드러지게
하얀 벚꽃이 멋들어지게
한 껏 제자리 넘도록 피어있는 사이,
볼품없이 두어 개 가지만 쭉 뻗어
'저기만 음지인가?' 싶을 만큼,
초라한 벚나무 한 그루가 눈에 확- 들어왔다.
그저 순간일 뿐이었다.
시속 p/km로 달려 지나쳐가는 버스의 속도에
비하면.
그런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터져버렸다.
창밖의 벚꽃잎처럼 하얀 눈물 방울들이
여기가 만원 버스인 줄도 모르고,
눈치 없이 투두 두두두둑 떨어졌다.
'만개한 황홀한 봄 사이
봐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벚나무'
나 같았다.
아니 저게 나인가 싶었다.
-
비슷할 즈음 들어간 동기는
나만 멍청이인가 싶을 만큼
후두 룩 하게 수월하게 일도 사회생활도
잘해나갔다.
아르바이트도 한 번
해본 적 없던 내가 처음으로 경험한
회사생활은
누구는 믿기지 않을 만큼 회전이 빨랐으며
누구는 친절하다가도 한없이 어려웠으며
누구는 불친절하다가도 한없이 따뜻했다.
어제 배운 것들은 다 알 것만 같았지만,
오늘은 또 모르는 것들로 겹겹이 쌓였으며
질문 한 번을 던져야 할 때도
질문 한 번을 회수해야 할 때도
나는 연실 틀리기 일수였다.
나만 못 알아듣는 것인지
쟤도 못 알아들었지만 문제없이 잘 해내는 것인지
내가 한 일에서는
왜 이렇게 문제 문제 문제 또 문제가 끝없이
나왔는지
나는 화장실 한 번 갈 여유 없이
앉아서 해보아도
왜 이렇게 시간은 부족하고
남들 다 집에 가야 할 밤은 빨리 왔는지
사실 모든 것은
그저 불완전한 것이 당연한
'처음의 미숙함'이었을 터인데.
그걸 알턱이 없던 세 달 차의 신입은,
매일이 주눅 들어 걸어가는 지뢰밭이었다.
매일 불완전한 나를
강단 앞에 세워두고
이 회사에 합격한 이유를
' 휴 쟨 어디 하나라도 완전한 곳이 없나 '
세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기분이랄까.
그래서 그 초라하고 보자 할 것이라고는
하나 없던
벚나무를 보자마자,
왈칵 생각했다.
옆에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빨리
제 봄인 줄 알고 다 제 꽃봉오리 터뜨려
만개하는데,
나만 봄이 왔는데도
창피하게 멀대같이 서있어서
휘황찬란한 봄을 방해하는 건 아닌지
연실 누가 그런 것도 아닌데
혼자 겁이 나고
주늑들어있었을 터.
-
아직도 그 길을 봄에 지나치면
그때를 기억한다.
몇 해가 지나버린
이제는 어떤 게 그 나무였는지
가늠도 할 수 없을 만큼
제 자리 빼곡히 벚나무가 숲을 이루어버렸지만.
어느 해
어느 날
어떤 벚꽃같이
출근길 내내
내 눈에서 벚꽃 망울 같은
눈물이 한가득 떨어져 버렸던 날.
그 해의 그날들이 있어,
오늘의 여기 무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내가 있음을.
나는 주로 있는 힘껏 잘 살아보기로 마음먹을 때,
곱씹어 도돌이표처럼 상기한다.